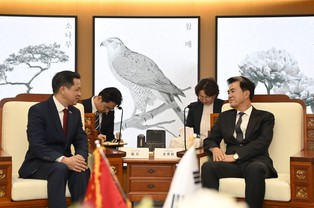[김상수 칼럼] 왜구(倭寇)가 약탈한 고려 불상, 고국 돌아왔지만 대법원 판사들 “일본 소유”
- 칼럼 / 김상수 / 2023-10-26 21:25:23
 |
| ▲왜구(倭寇)에 약탈당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 |
[칼럼] 언론인 김상수 = 도대체 어느 나라 대법원 판사들인가? 일본 법원 재판관들 아닌가? 국가 문화재 기초 이해 기본 인식의 무지(無知)가 빚은 참사(慘事)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이는 한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국가 문화재를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단순 장물(贓物)로 문화재를 그르치게 몰이해하면서 법적용 이해의 오류를 범한 것에 까닭이 있다. 1심 판결에서 불상의 한국 귀속 판결과 달리 2심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은 문화재를 민법의 ‘유체동산 인도 소송’으로 파악, 취득시효 문제로 본 것이다. 한국의 민법이나 일본의 민법이 부동산은 20년간, 동산의 경우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장물 점유권으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한국의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당초 부석사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일본이 점유했다면 일본 쓰시마 섬 소재 관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년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한국인에 의해 불상이 한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계속하여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했다”며 “관음사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는 역사와 문화재 가치에 대한 무식 무지다. 한국인이 왜구애 약탈당한 문화재인 고려 불상을 다시 한국인이 비록 훔쳐온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단순 장물, 단순 물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문에서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이 파악됐다면 민법의 취득시효 법리만으로 불상을 봐서는 안 된다. 문화재 이해에서 통시적 가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계시켜 문화재 가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쓰시마 관음사가 취득시효가 완료되었기에 일본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발상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일본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한 터무니 없는 요구에 순순히 투항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고려시대 약탈 불상이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게 일본 측 억지 주장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임의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어리석은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2017년 1월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불상은 서기 677년 창건된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서주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됐다”가 원래의 곳으로 온 것이기에 부석사 귀속은 당연하다는 판단이 맞는 것이다.
이는 민법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정부가 당시 조선에 함선과 군대를 보내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불태우고 5,000여 권 이상의 서책이 불타고 조선시대 의궤(儀軌)를 비롯한 340여 도서를 훔쳐갔다.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 폐지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고, 1979년 파리국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박병선이란 분에 의해 이 문서가 외규장각 의궤라고 밝혀냈다.
1993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TGV의 대한민국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방한하면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을 반환하며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의 전체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후 오늘까지 그 약속을 프랑스정부는 지키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그때 프랑스 법원이 점유권을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 딱 한 문장이다.
“프랑스 문화재가 된 외규장각 한국의 도서는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후 한국과 프랑스 간 밀고 당기는 협의 끝에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의 정상 회담 이후 외규장각 도서 일부를 5년마다 갱신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지난 200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부관장이 독일의 금속활자본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간행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에 공인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금속활자 서책 ‘직지’(直指) -직지의 정확한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인데, 이를 짧게 ‘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 부른다-를 언론 매체에 공개했을 때, “이 금속활자 서책은 절대 이곳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반출될 수 없다. 이 서책의 외부 반출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꺼내는 것과 같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는 한국의 고려시대 유물이지만 프랑스 문화재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직지’는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백운 화상이 석가모니의 직지인 심견성성불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 인류 문명을 바꾼 획기적인 사건인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고려시대 때 인쇄된 ‘직지’ 원본의 소재에서 프랑스는 민법의 ‘점유권’을 말하지 않았다. 인류 통시적 문화가치로 프랑스 문화재가 된 사실을 강조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왜구가 1352~1381년 서주(충남 서산의 고려시절 명칭) 일대를 5회 이상 침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부석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원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어떻게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되찾아온 14세기 고려 불상이 일본 소유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만약 역지사지(易地思之) 일본의 최고재판소라면 한국의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했을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부석사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은 근본에서 틀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지한 판결을 한 한국의 대법원 판사들은 일본국 내지(內地)가 파견한 조선총독부 판사들인가? 식민의식이 재생 내재화된 말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고려불상 일본에 소유권' 대법원 판결 존중"이라고 발표했다. 미쳤다. 참혹하고 참담하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금 한국에 있다. 일본으로 보내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한국에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 불교계가 “약탈해 강제로 국외 반출된 것이 명백한 도난문화재에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http://www.kimsangsoo.com/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