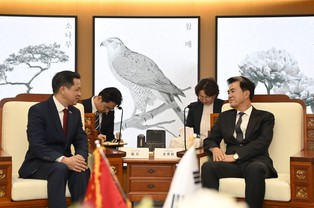[제종길의 화요칼럼] 가시박의 기세가 드세다.
- 칼럼 / 제종길 / 2024-10-08 13:58:48
 |
▲가시박은 전반적으로 색도 연하고 꽃도 연녹색이라 다소곳해 보이만 이들의 서식지 장악력은 사납고 무섭다. |
멀리서 보면 칡넝쿨처럼 보이나 가까이에서 보면 잎이 더 연해 보여서 도저히 자연에서 악역을 맡는 식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생김새와 달리 기존의 식물군집을 유린하고 토종식물들을 서식지에서 내쫓는다. 무서운 기세로 주변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 정글에서 개미 떼의 공포가 있듯이 가시박이 가는 곳에는 다른 종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 물론 나무도 예외가 없다. 안산천에서 일부 벽오동과 무궁화도 위기에 놓여 있다.
네이버 백과에 따르면 “가시박은 호숫가 주변의 들판이나 비탈진 강변에서 수십 미터 높이의 큰 나무까지 뒤덮으며 자라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햇빛을 받을 수 없게 하여 말라 죽게 한다. 또한 가시박 자체에서 타 식물을 고사하게 하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를 타감작용(allelopathy, 他感作用)이라 하며 주변의 다른 식물들을 살 수 없게 만든다.” 한다. 병충해에도 강해 국내에서 오랫동안 적응하여 자라온 일반 식물뿐 아니라 넝쿨 식물도 아예 경쟁이 되지 않는다. 안산천에 나가면 바로 이 생생한 현장을 관찰할 수 있다. 식물들을 휘감아 넘어뜨리고 잎을 빽빽이 뒤덮어 꼼짝 못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워낙 크게 영향을 미쳐 환경부에서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공포의 대상은 단풍잎돼지풀이었다. 역시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식물로 미국을 통해 들어 온 것으로 알려진 다년생 귀화식물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분포를 넓히고 있다는데 충청도까지 퍼져나간 것을 보았다. 천변 나대지나 버려진 땅을 차지하고, 크게 자라서 3m가 넘는 경우가 많다. 줄기가 두껍고 강해서 다 자란 것은 나무 같다. 잎도 크서, 빽빽하게 밀집해서 자라면 작고 약한 우리 풀들은 감히 그 옆에 서 있지도 못한다. 예전, 아마 30여 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자리공이 서울 남산에 나타나 기존의 풀들을 밀어내고 풀을 찾던 벌과 나비가 사라지자 새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소동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동네 천변에서 작은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 외래식물이 주원인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환삼덩굴은 덩굴식물이다. 이 식물은 지난달 중순까지 최강자였다. 기세가 등등했고 경사면을 거의 다 뒤덮었으며 “나랑 맞설 친구 있으면 나와 봐!”하고 거만을 떨었다. 일부 사람들이 환삼덩굴을 유용하게 쓴다고 하지만, 그 이용 정도가 이들이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는 것을 막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종도 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요즈음 이 식물이 분주하다. 꽃대를 세워서 꽃을 막 피우는데 무척 바빠 보인다. 다 가시박 탓이다. 줄기에 가시가 많은 환삼덩굴도 색이나 덩굴의 억센 정도가 훨씬 연해 보이는 가시박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새로운 강자가 영토를 다 뒤덮기 전에 더 자라 씨앗을 퍼트려야 했다. 그동안 일부 장소에서 환삼덩굴에 맞서 이겨내고 있었던 호박도 가시박의 기세에는 주춤하는데 확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아마 얌전하고 부드럽게 생긴 이 신흥 강자인 가시박은 자라는 속도도 속도지만, 식물을 감는 기술이 훨씬 탁월한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처럼 생긴 덩굴이 다른 식물을 여러 겹으로 휘감고 빠르게 자라면서 잡아당기고 올라타니 강해 보이던 단풍잎돼지풀도 식물의 꼭대기가 땅에 닿을 정도로 휘어진다. 놀라운 공격력이다. 가시박은 자라고 퍼져나가면서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대동한다. 완전 신기술이다. 두 종 – 단풍잎돼지풀과 환삼덩굴은 몇 달째 자라고 살다가 이제야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기려 하는데, 가시박은 여름 끝에 새로운 초토화 전략을 가지고 등장하여 온 하천 경사면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
| ▲가시박이 단풍잎돼지풀을 넘어트리고 환삼덩굴이 보이지 않은 정도로 그 위를 뒤덮어 버린다. |
그러니까 이 세 종의 문제는 우리 땅에서 기존 식물들을 내쫓고 서식지를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꽃가루는 아토피 등 사람들의 피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꽃을 피우는 정겨운 덩굴식물은 나팔꽃류인데 토종 나팔꽃은 변두리로 밀려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미국나팔꽃이다. 어쩌다 꽃을 피운 일반 식물을 발견하곤 반가워 다가가 보니 미국쑥부쟁이다. 그나마 당당하게 곧추세워 꽃을 내보이는 우리 종은 수변에서 자라는 고마리 정도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토종 민들레는 도시 주변에서 쫓겨난 지 오래다. 도시에서 봄을 장식하는 노란색 꽃은 서양민들레다. 봄에 위세를 떨치던 말냉이와 붉은토끼풀은 유럽이 원산이다. 여름을 장식하는 망초와 개망초 무리도 외래산이다. 이들 식물을 통제하려면 식물의 생태를 잘 알아야 하고, 적절한 제거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다 자란 개망초류가 가득한 풀밭을 기계로 쳐내면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금방 올라온다. 할 수만 있다면 비가 온 다음 날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드센 위 세 종을 제거할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가시박이 더 자라기 전에 그리고 세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기 전인 지금이, 힘들어도 일손이 제일 적게 드는 때인 까닭이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풀들이 어울려 사는 꽃밭을 만드는 일에도 잘 만들어진 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봄, 주변 풀밭에서 단아한 우리 토종식물들의 꽃을 보고 싶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