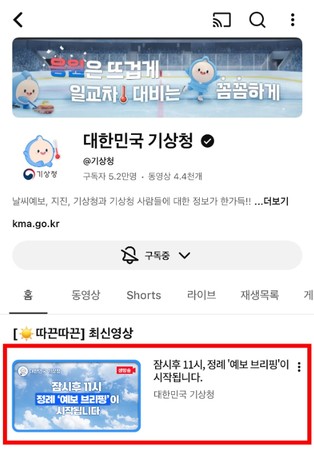맹자 어머니의 교육관
- 오피니언 / 임규모 / 2022-09-02 12:22:38
 |
| ▲ 이길주 전 세종 다빛초 교장. |
조선 시대 사대부가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장원 급제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자녀가 과거를 보기 위해 원행을 떠나면 그날부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 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사대부가뿐만 아니라 중인가정의 자제를 둔 어머니들 역시 역관, 산술, 천문 시험 등을 볼 때 똑같이 정화수를 떠 놓고 빌었다. 정화수를 떠놓고 자녀와 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것이다.
자녀가 과거에 급제해도 어머니의 정성은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정화수를 올리고 기도를 한 것은 자녀가 오로지 잘 되길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맹자는 전국시대(戰國時代) 때의 사람으로 우리가‘공자왈 맹자왈’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공자와 맹자가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자는 BC 551~BC479의 사람으로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사람이다. 반면 맹자는 BC371~BC289의 사람이다. 맹자는 공자 사망 후 100년 이후에 출생한 것이다.
어려서 맹자의 집은 공동묘지 근처였기에 맹자는 친구들과 상여 옮기는 모습과 곡(哭)하는 소리를 흉내 내는 놀이를 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교육상 좋지 않다고 여겨 시장으로 이사를 했으나 이번에는 맹자가 친구들과 장사 흉내를 내며 노는 것이었다. 이 또한 좋지 않은 환경이라 여긴 어머니는 서당골로 이사를 하게 됐다. 여기서 맹자는 글을 읽는 흉내도 내고 예절을 갖추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일화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의 어머니 급씨(伋氏)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 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야기는 한나라 때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에 전해온다. 이런 어머니의 노력이 맹자를 공맹(孔孟)의 큰 그릇, 즉 공자의 뒤를 잇는 큰 유학자를 탄생하게 한것이다.
그러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기 위해 그 어려운 시기에 이사라는 것을 택했다. 여기서 ‘이사’는 곧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환경의 변화를 준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새로운 환경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았다. 서당골에서 맹자는 학문과 예절을 익혀가면서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면서 맹자는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열어 간다.
현대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모의 노력과 재력과 간섭으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아이마다 받아드림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마부는 말을 강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으나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듯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일부 부모는 자식을 공부라는 굴레를 씌워 지나치게 압박하기도 한다.‘내 아이 만큼은 달라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분야에서는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내 아이를 거목으로 만들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